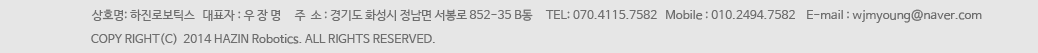정부 로봇 연구개발 정책 동향
정부가 로봇 연구개발 정책의 중심을 서비스용 로봇에서 제조용 로봇으로 전환하고 있다. 제조용 로봇 경쟁력이 곧 국가 제조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9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제조공장을 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조로봇 연구개발(R&D) 사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 역시 로봇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서비스용에서 제조용 로봇으로 조정하고 있다.여기에는 휴머노이드 등 '보여주기' 효과는 있지만 당장 상업화가 어려운 연구개발보다는 제조현장에 투입돼 생산효율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조용 로봇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조용 로봇 신규 연구개발 과제 예산을 30억원 규모로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산업핵심기술사업 신규과제 중 로봇 관련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또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남도 주도로 진행하는 제조용 로봇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로봇비즈니스벨트'에 총 1283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제조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하자는 취지다. 이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상태며, 오는 11~12일 산업통상위 예산결산조정소위를 거쳐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그간 우리나라 로봇 연구개발 정책은 서비스용 로봇에 편중됐던 게 사실이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착수한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과제 내역(사업비 3287억원)을 보면, 전체 과제에서 서비스용 로봇 과제가 약 51%, 제조용 로봇 과제가 21%로 격차가 크다. 이에 정부는 제조용 로봇 과제 비중을 내년에는 30% 이상으로 높이고 해마다 확대할 방침이다.박현섭 KEIT 로봇PD는 "우리나라는 로봇산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제조용 로봇이 '찬밥' 신세였고 거의 모든 투자가 서비스용 로봇 분야에 집행됐다"며 "제조용 로봇에 투자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우리도 정책 포커스를 서비스에서 제조용으로 변경해야 맞다는 판단에서 현재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평균임금 증가로 인건비 메리트가 줄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제조공장의 '리쇼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유도하면서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제조용 로봇 개발"이라며 "제조용 로봇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